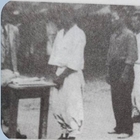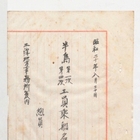![<strong>영주 만죽재 고택 </strong>[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3821072_fac6cf.jpg)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반남박씨와 선성김씨가 모여 살며 전통을 이어온 경북 영주 무섬마을의 옛집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을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예고했다.
두 고택은 영주 무섬마을을 대표하는 가옥이다.
만죽재 고택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 반남박씨 집안의 박수(1641∼1729)가 마을에 들어와 터를 잡으면서 지은 집으로, 360여년간 집터와 가옥이 온전히 전해져 왔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항일 격문집, 박승훈 작성 혼서(예장지) 규방가사, 박창은 호구단자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39243049_d1a83a.jpg)
고택은 안채, 사랑채, 부속채 등이 연결된 'ㅁ' 자형의 주택이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중·후기 상류 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 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죽재 고택에는 옛 생활과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남아있다.
전통혼례를 치를 때 신랑 집안에서 신부 집안에 보내는 혼인 문서인 혼서지(婚書紙)를 비롯해 호주가 호(戶·집)의 상황을 적어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등이 잘 보관돼 있다.
![<strong>영주 해우당 고택 </strong>[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42380851_8d37c0.jpg)
명성황후가 1895년 10월 일본군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 후 영남에서 일어난 항일 운동 기록을 필사한 항일격문집, 만죽재에 전승돼 온 내방가사를 모은 문집 등도 있다.
'관직도표'를 그려놓고 주사위를 던져 숫자에 따라 말을 놓고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인 승경도(陞卿圖) 관련 자료도 있어 당대 생활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위는 사랑채 편액으로 쓰인 현판으로 흥선대원군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래는 고택을 중수할 당시 대은암 옆에 지은 정자라고 전하는 대은정 현판.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42482144_fb689f.jpg)
그의 아들인 해우당 김낙풍(1825∼1900)이 1877∼1879년에 고택을 수리한 이후 해체하거나 수리한 적이 없어 150년 가까이 원형이 잘 보존돼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낙풍은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의 친구로, 현재 사랑채에 걸려있는 '해우당' 현판은 흥선대원군이 쓴 친필로 알려져 있다.
해우당 고택 역시 'ㅁ' 자형으로 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안방에서 태어나서 목방, 작은사랑, 큰사랑 등으로 옮겨가는 생애주기와 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strong>해우당 사랑채 전경 </strong>[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42536287_fd6fa2.jpg)
해우당 고택 역시 여러 고문헌과 서화, 글씨 등이 전한다.
김낙풍이 작성한 과거 답안지, 집 건물을 수호한다는 성주를 모셔두는 단지, 갓 보관함 등도 남아 있어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함께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약 1달간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등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확정한다.
해우당 고택은 선성김씨 집안에서 마을에 처음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1732∼1809)의 손자 김영각(1809∼1876)이 1800년대 초반에 지은 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