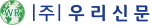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최근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친일 국방’ 논란이 벌어진 것을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극대화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은 일본 군사전력을 포함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가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안보협력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안보협력을 ‘투트랙’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인다면 상당한 물자가 일본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도 그랬듯 한국 입장에선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해상 공격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해상이라는 넓은 구역에서 일본 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안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미군이 한반도에 있기는 하지만 주된 존재는 주일미군”이라며 “병력만 해도 주한미군은 2만5000여명, 주일미군은 5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군이 작전을 한다면 일본 기지를 활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본의 협력 없이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며 “현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한·일 안보협력에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며 실전 운용력을 높인 상태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협력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최대치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탁월한 미사일 탐지·식별·요격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인 대잠수함전 능력은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며 “특히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 항구로 들어온다면 기뢰를 깔 텐데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은 일본이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일본과의 무조건적인 안보협력이 능사는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일본의 군사적 도움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일본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이 독도에서 15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독도 영유권을 여전히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를 감안하면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안보협력은 별개로 가져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과거사 문제를 안고 안보협력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대한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양 위원도 “지금 상황에선 과거사와 안보 문제가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로 떼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사로 갈등이 커지면 안보협력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두 개를 결합시키면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안보협력은 못한다는 결과로 귀결된다”며 “이 또한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