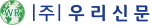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2차 대전을 더 이상 인간들의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이 전쟁은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경험하고 함께 겪은 전쟁이었다."
영국의 동물사 역사학자인 힐다 킨은 최근 출간한 저서 '전쟁과 개 고양이 대학살'(책공장더불어)에서 전쟁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 겪은 비극으로 재해석한다. 그는 240여개에 달하는 문헌과 기록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은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겪은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1939년 9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영국에서 약 75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독일의 폭격이나 영국 정부의 명령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영국인이 폭격과 식량 부족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살해했다.
'런던의 어느 동물병원에서는 트럭 세 대분의 사체가 실려 나왔다'고 기록될 만큼 자발적인 대규모 학살이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극도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였다.
당시 대부분의 영국인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며 안락사를 선택했다. 자녀를 시골로 대피시키고 암막 커튼을 설치하던 것처럼 동물을 죽이는 것도 전쟁 준비의 일환이었다. 저자는 참혹한 동물의 희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정당화됐다고 지적한다.
동물의 수난은 비단 영국 내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전쟁에 휘말린 모든 유럽 국가에서 개와 고양이는 물론 소와 양과 같은 목축 동물들이 마을을 점령한 군인에 의해 살해되거나 굶주림에 쓰러졌다.
다행히 모든 동물이 2차 대전의 희생자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2차 대전 중 개와 고양이가 인간과 생존의 동반자로 지낸 사례도 풍부하게 제시한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무너진 집에서 구조된 동물에게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눠줬고, 독일군의 포탄이 떨어지면 곳곳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방공호로 향해 달려가는 풍경이 펼쳐졌다.
동물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개는 전쟁 내내 방공호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등 구조 활동에서 크게 기여했다.
저자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동물과 인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을 겪는 동안 동물은 인간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함께 삶을 견뎌내는 동반자가 됐다. 이런 이유로 2차 대전 이후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완벽하게 새로 정립됐다고 저자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