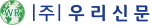![<strong>다산 정약용이 광산 박종유에게 보낸 간찰 </strong>[낙산고문헌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0833/art_17236197988882_9ec09e.jpg)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혹 주선해서 선혜청의 일 잘 아는 아전을 초치해서 꼭 찾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중략) 일이 성사되면 그가 의당(마땅히) 수십 량의 돈을 해당 아전에게 보은할 것입니다."
14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수탁 중인 '구당가 소장자료'를 보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이 광산 박종유(1789∼1848)에게 서신을 보내 부탁하는 대목이 나온다.
정약용은 서신에 "세선(稅船) 복호(復戶·잡세를 면제해줌) 문제는 유상(留相·광주유수)이 말하길 '선혜청 사례등록 절목'(宣惠廳事例謄錄節目) 중에 관련 문구가 있으면 의당 이전 관찰사의 처분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마 '충주 가흥창 조선 절목' 중에 (복호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미 본전세(本田稅)를 운반하니까 이 절목이 혹 호조(戶曹)에 있을 수도 있겠다"며 "꼭 형이 상세히 해당 아전에게 언급해 기꺼이 찾아내달라"고 당부했다.
요약하자면 조세 제도인 대동법을 집행하는 관청인 선혜청의 실무자를 찾아가 세금으로 거둔 쌀을 배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조운선 선주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서신이 작성된 시기는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인 두물머리(오늘날 경기 양평군)로 돌아온 이후다.
서신을 통해 정약용이 고향에서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법률 조언을 해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종유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대명사 격으로 현대인들에게 인식되는 박문수(1691∼1756년)의 증손뻘로, 정약용의 제자이자 이웃이었다.
두물머리 실학박물관 근처에는 박종유의 집터가 남아있는데, 이 집터 동쪽에 정약용의 생가인 여유당(與猶堂)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팔당호에 잠겨 있다.
정약용보다 27세 어린 박종유는 정약용의 두 아들과도 절친했으며 두릉시사(杜陵詩社)라는 이름의 문학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정약용이 박종유에게 보낸 서신은 박문수의 후손인 고령박씨 진사공파 집안이 지난 6월 13일 수탁 협약을 맺고 규장각에 맡긴 구당가 소장자료의 일부다. 박문수의 증조부인 구당 박장원(1612∼1671)을 시작으로 11대 300여년에 걸쳐 만들어져 구당가 소장자료로 불린다.
구당가 소장자료는 가서(家書·집안 사람끼리 주고받은 편지), 시고(詩稿·시의 초고), 병록(病錄·병의 증세를 적은 기록), 교첩(敎牒·5품 이하 관리로 임명될 때 받는 임명장) 등 5천153종 8천547점으로 이뤄졌다. 규장각이 수탁한 자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strong>규장각에 수탁된 고령박씨 가서 일부 </strong>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0833/art_17236198940284_cfc495.jpg)
고령박씨 집안 자료는 규장각 외에 성균관대 존경각과 천안박물관에도 대량으로 소장돼 있다.
박종유의 외가인 평산신씨 집안 자료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돼 있어, 이들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조선 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수도권에 사는 사족)과 양반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규장각은 구당가 소장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마쳤으나 예산 문제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진 못한 상태다.
김현영 낙산고문헌연구소 소장은 구당가 소장자료에 대해 "경화사족과 두릉시사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긍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은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왕의 남자'가 제작된 것도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당가 소장자료의 원문과 해설을 디지털화해 대중에 제공하면 귀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